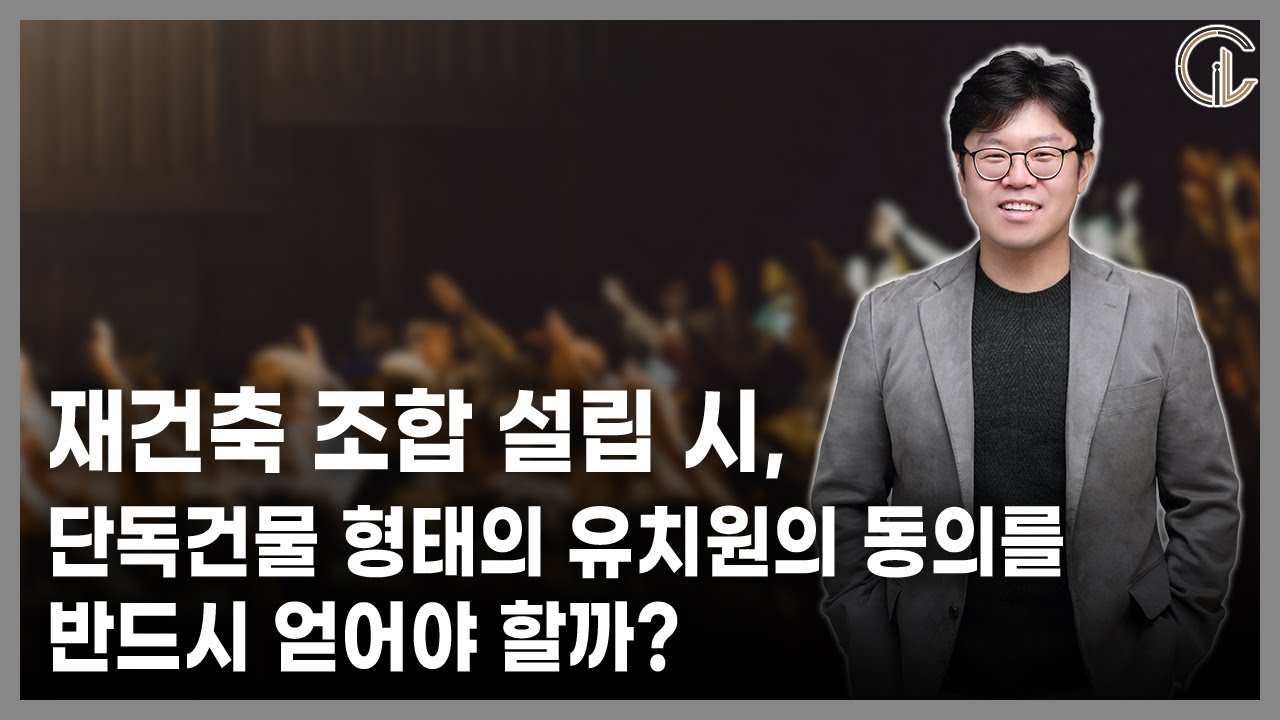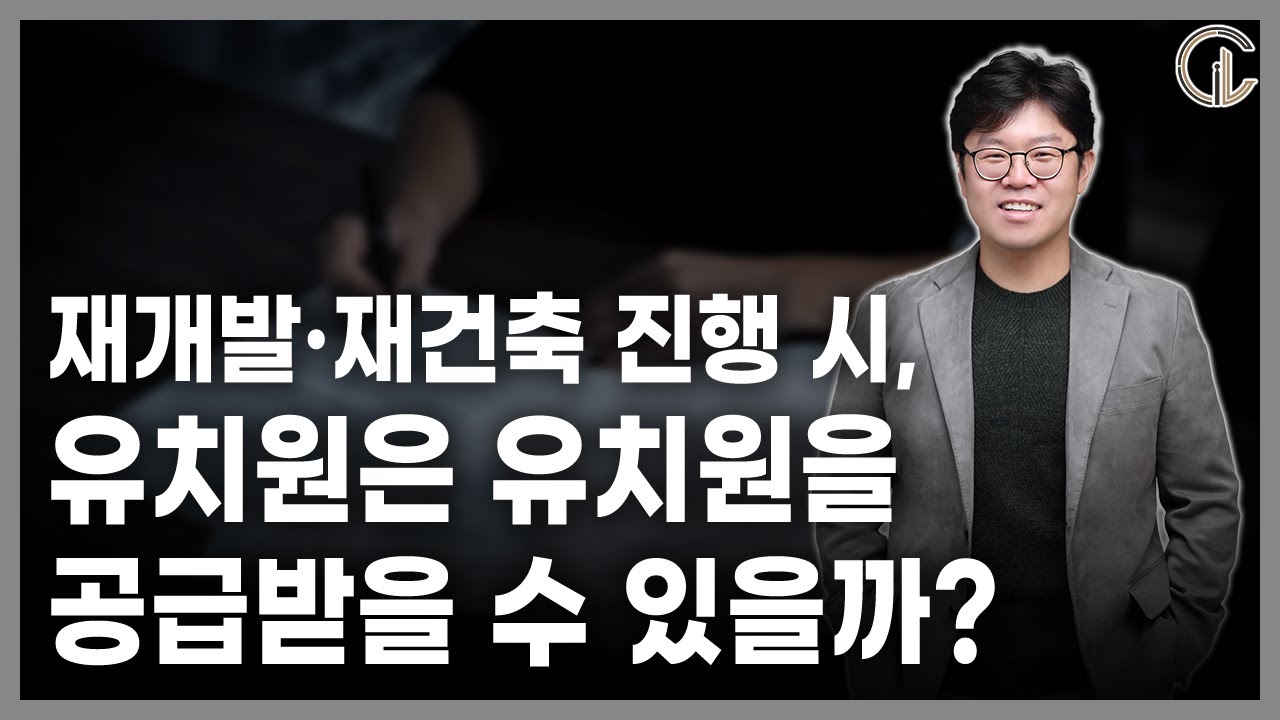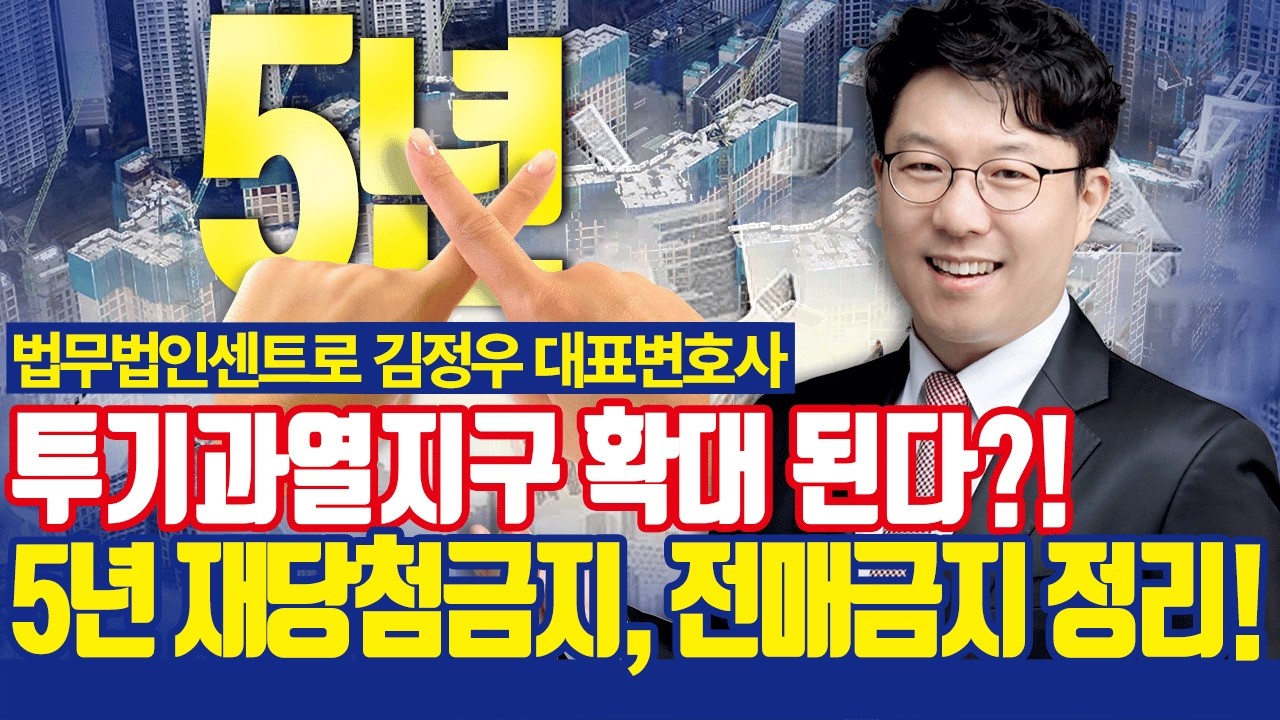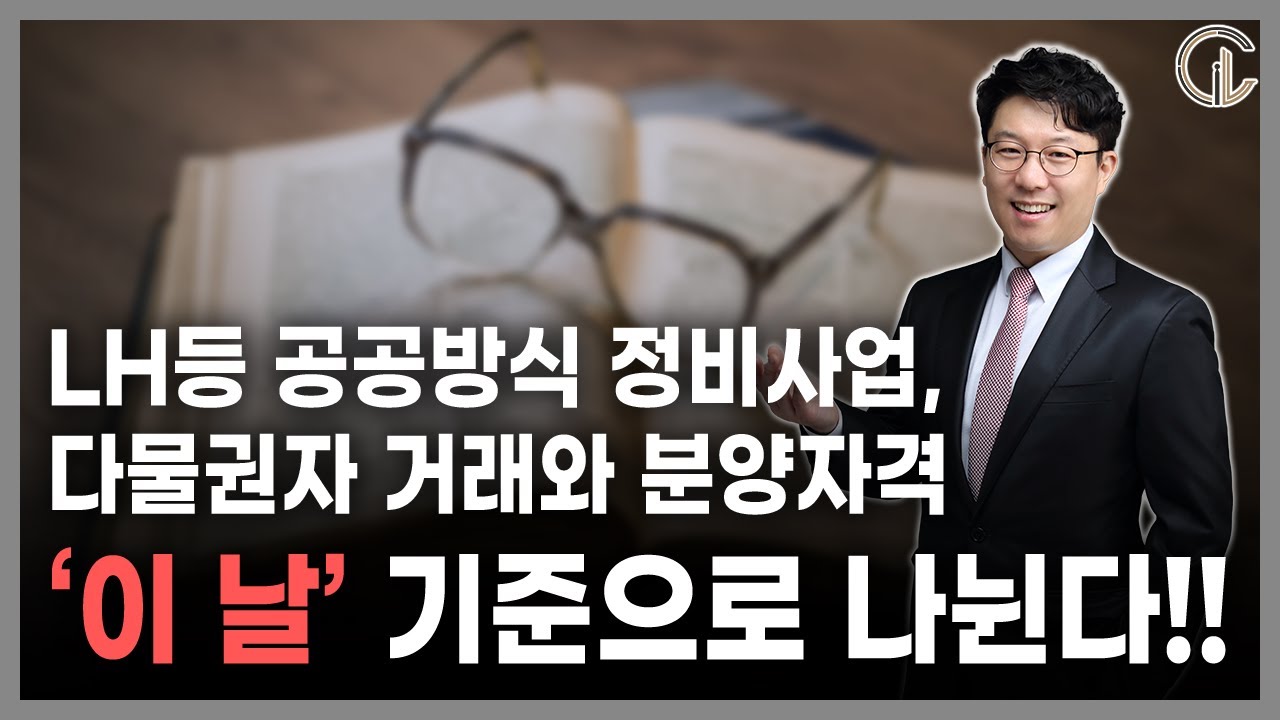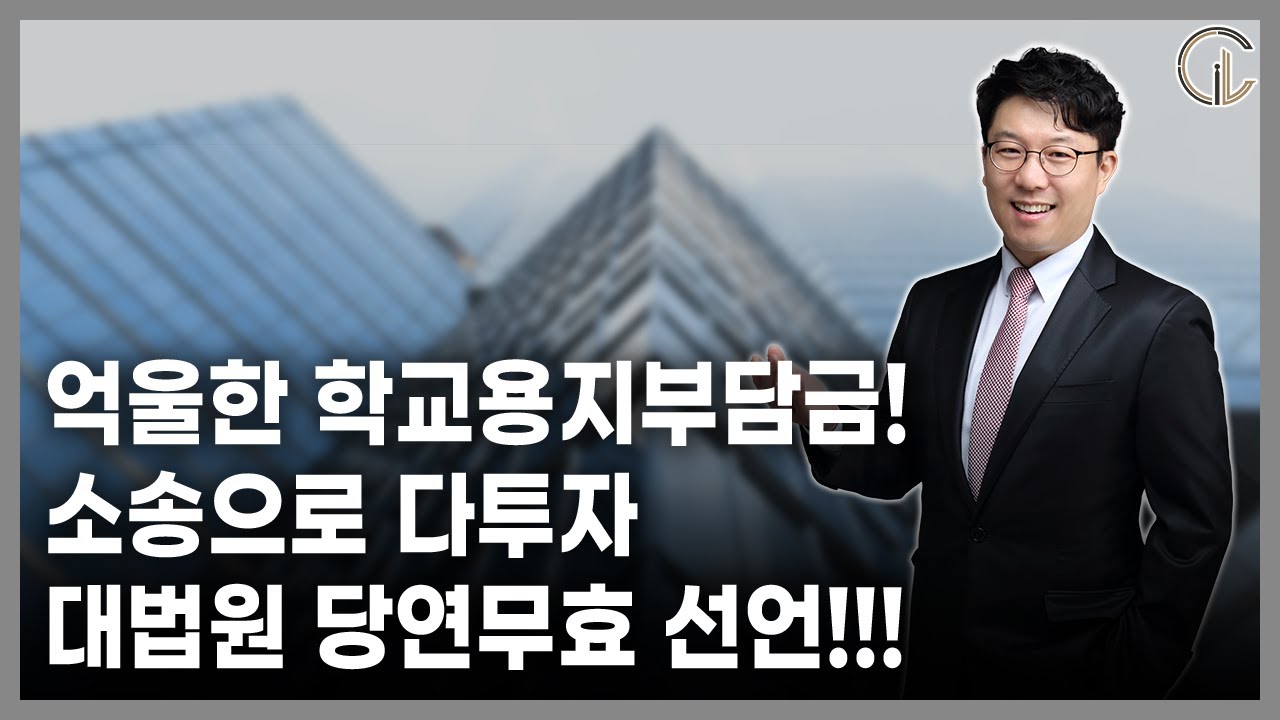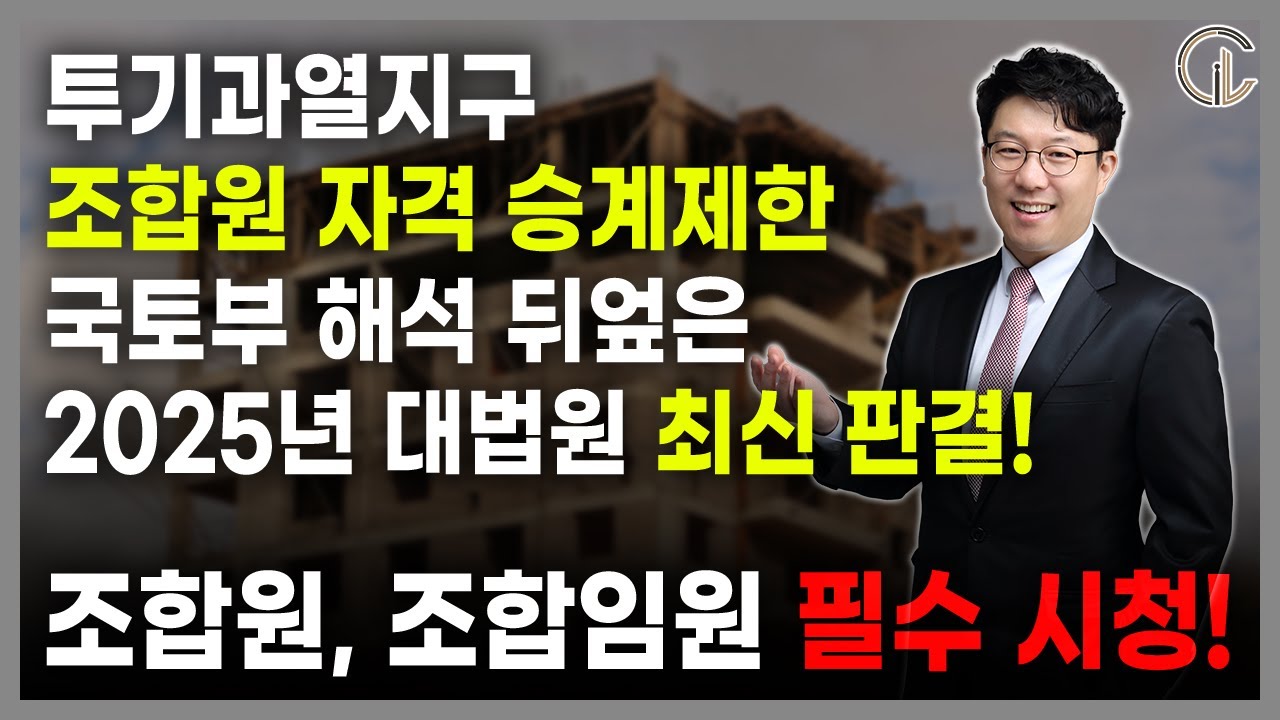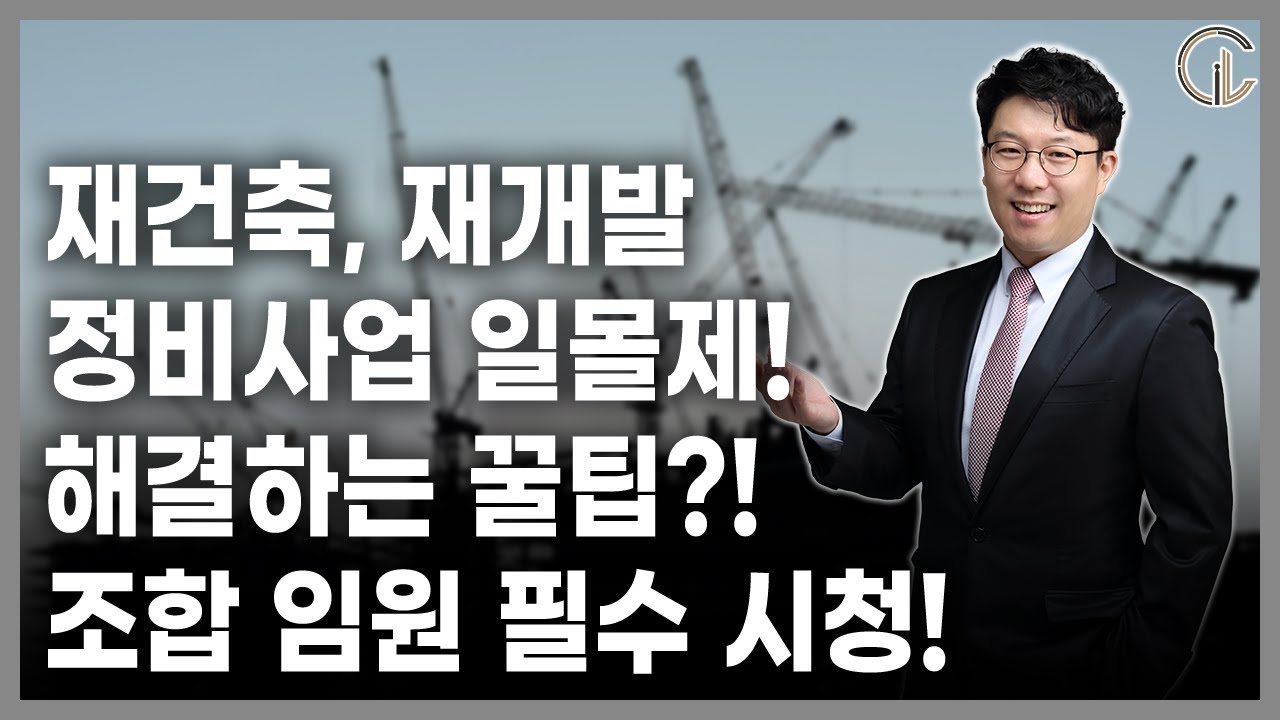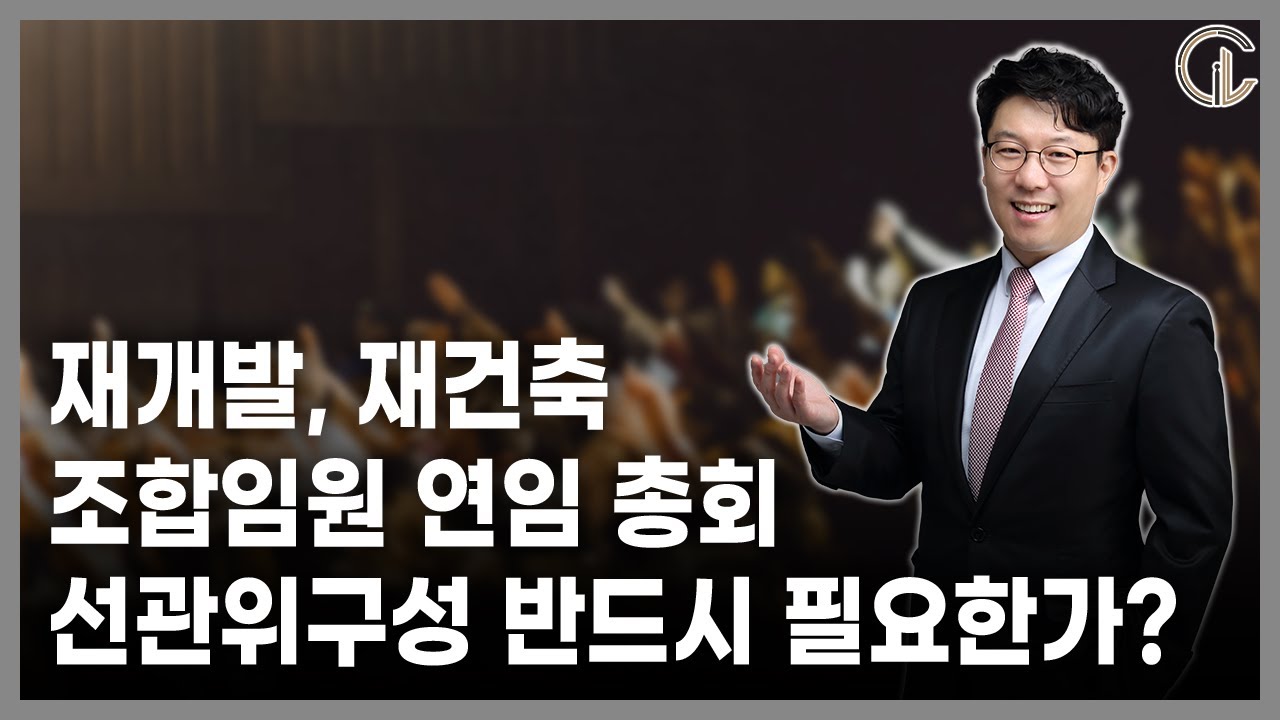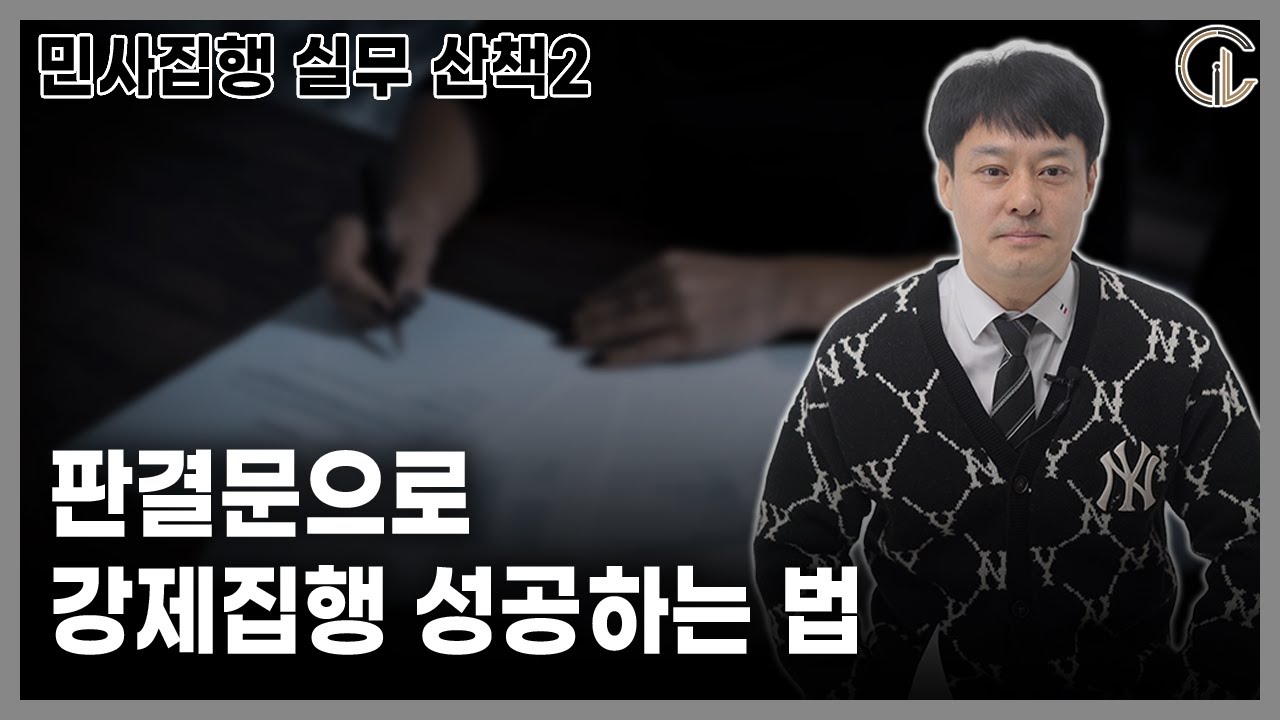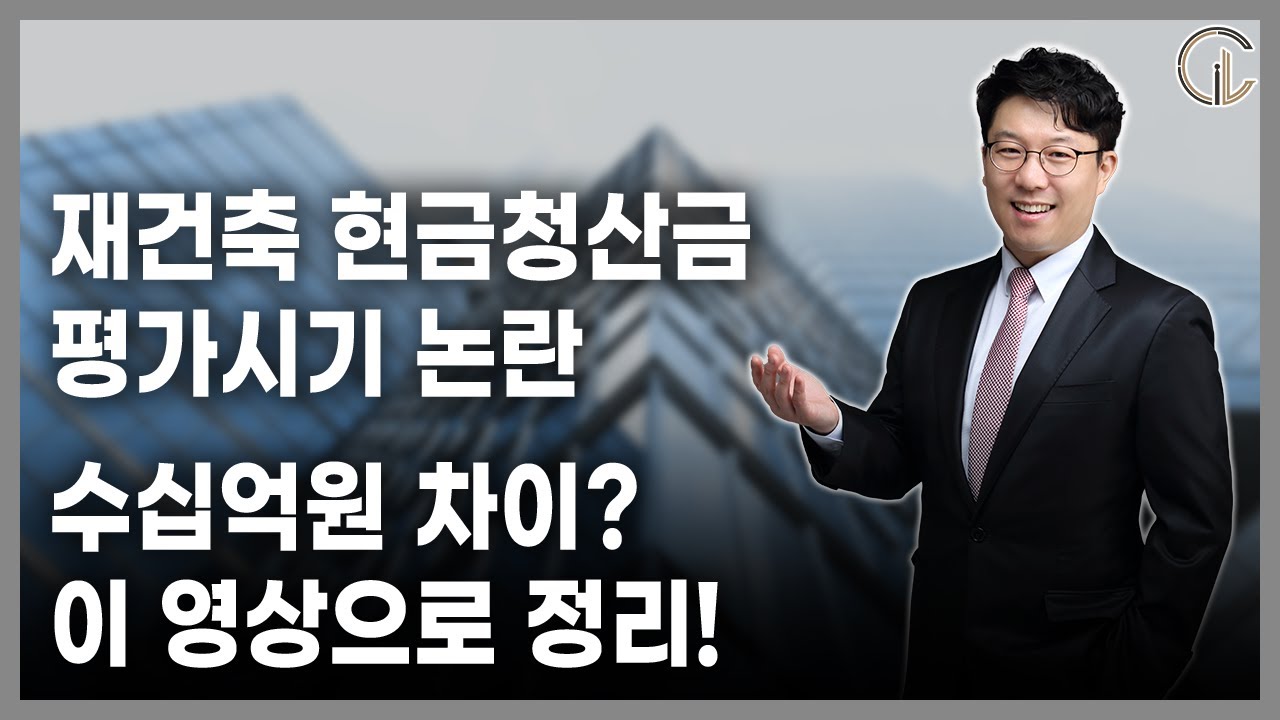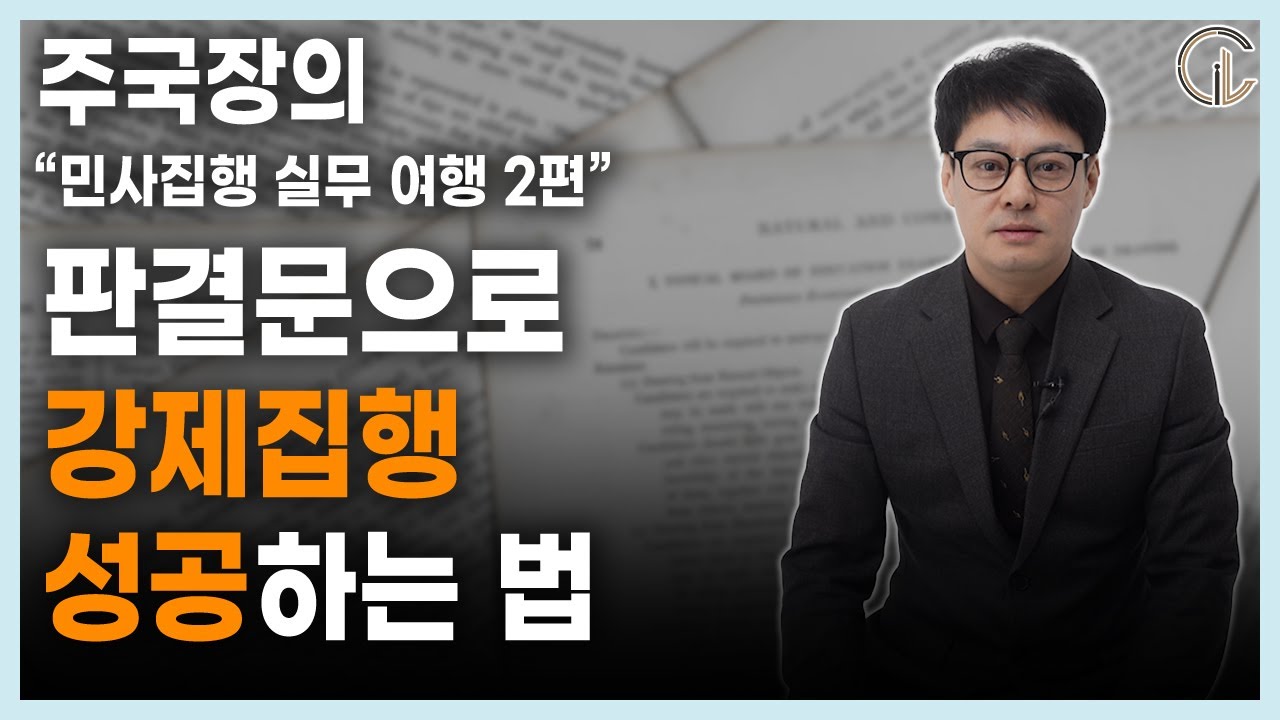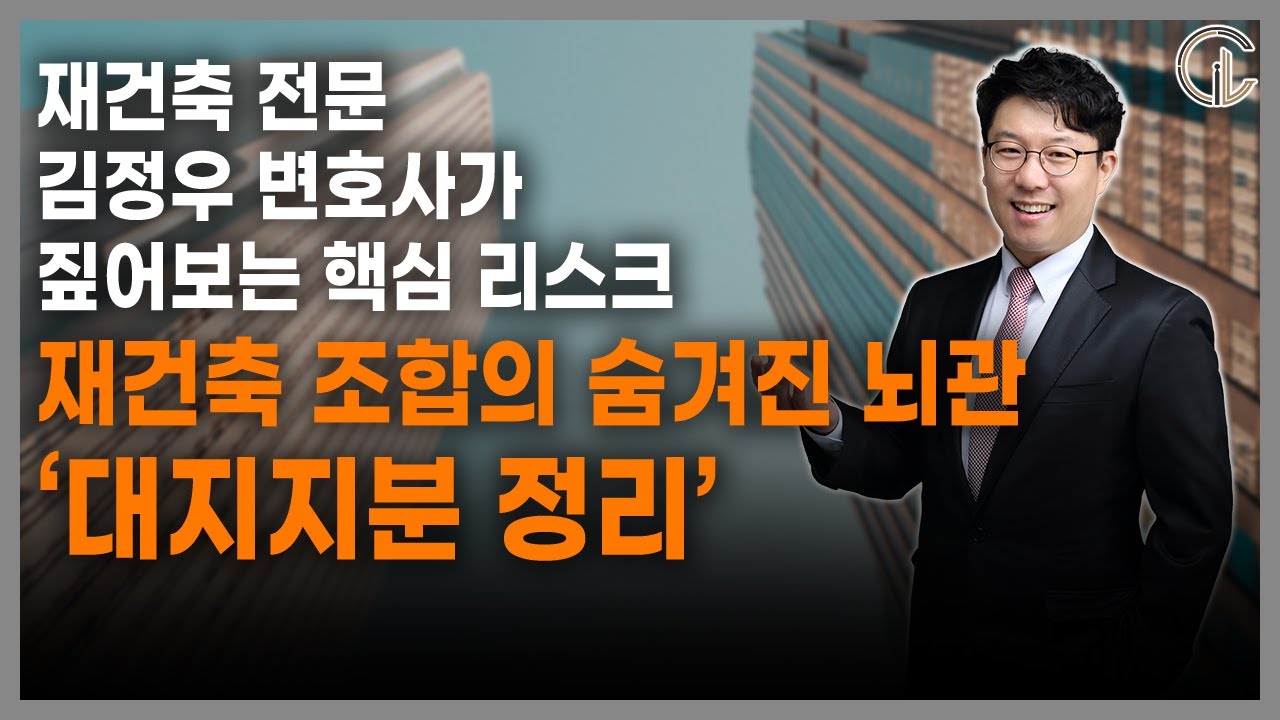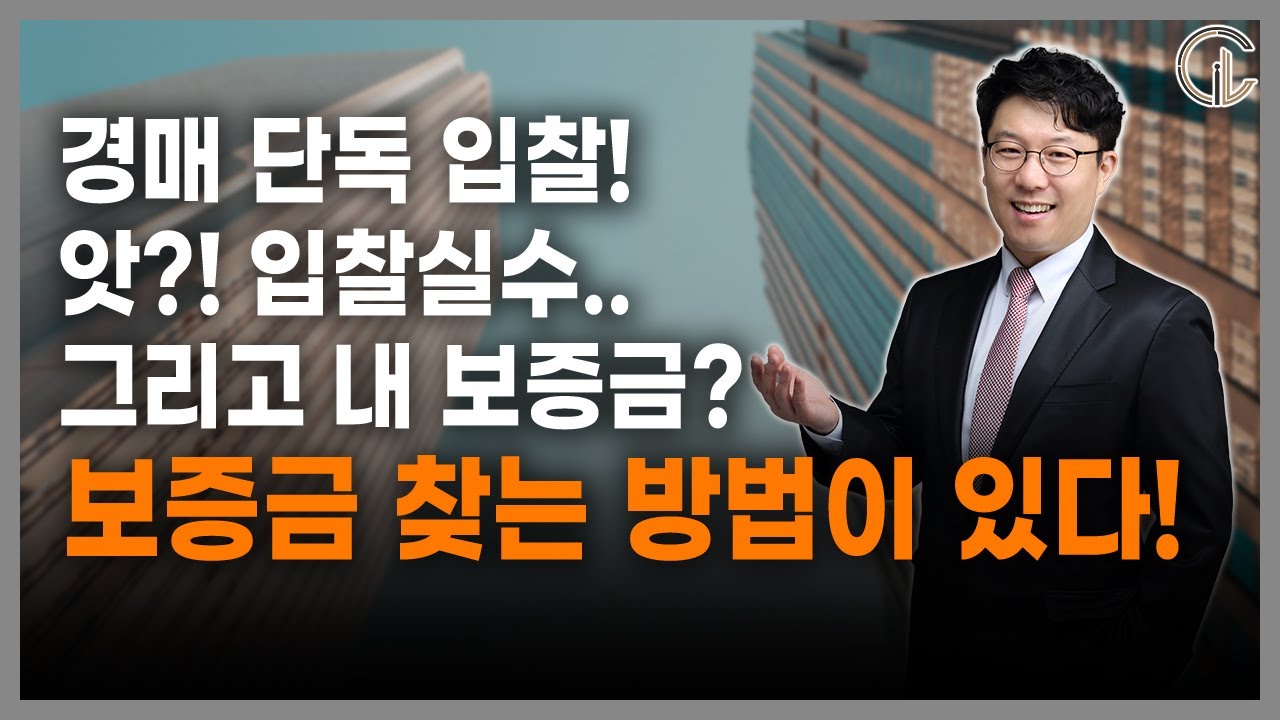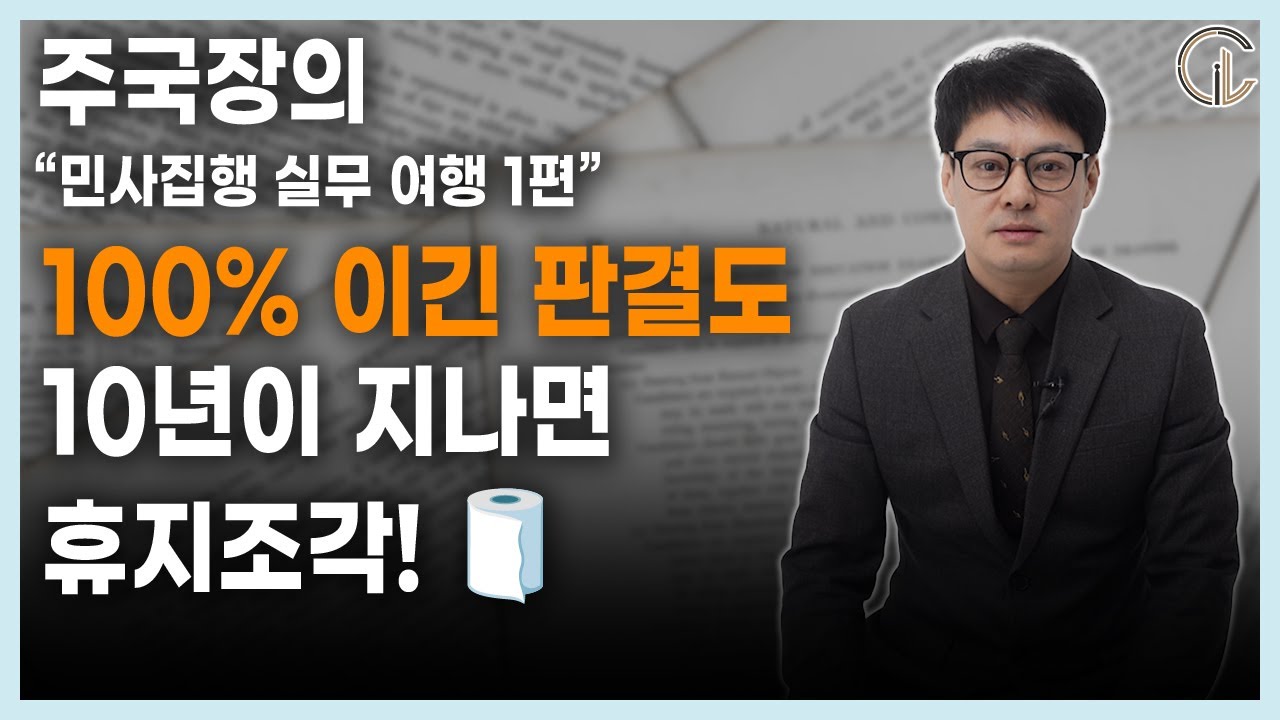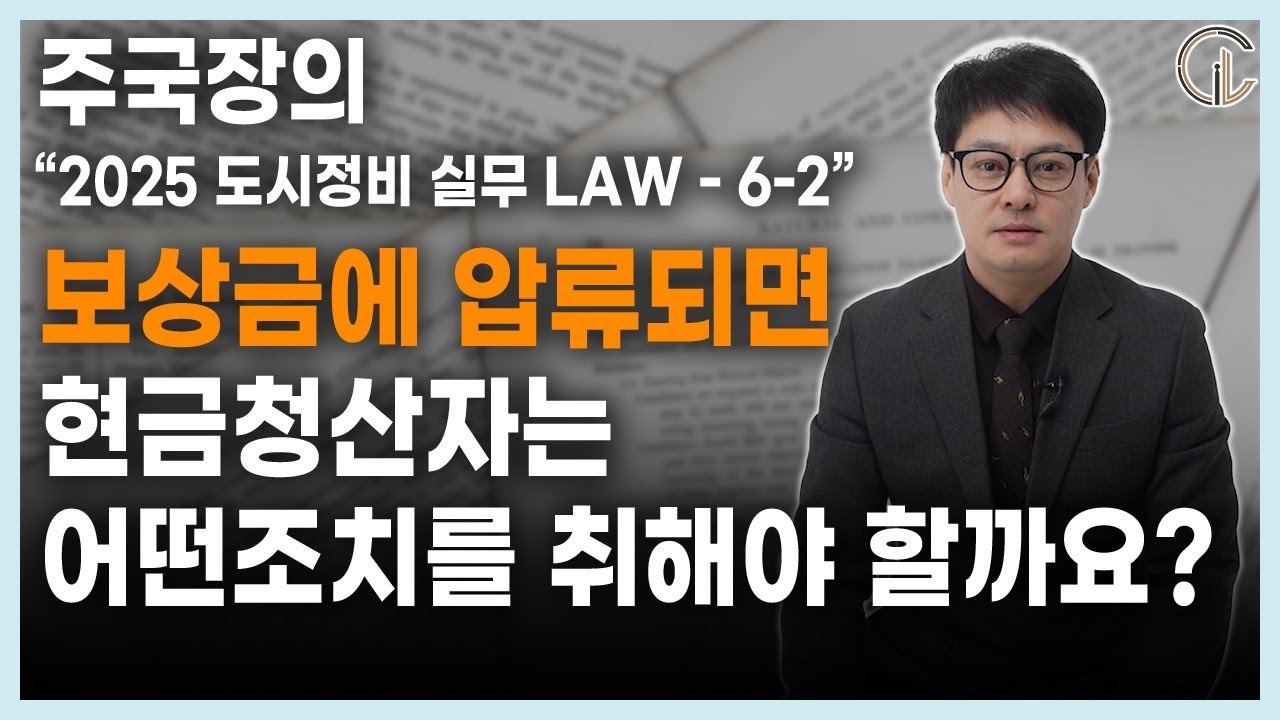복잡한 법률 고민,
1분이면 진단 가능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재개발·재건축부터 조상 땅 찾기까지,
1분 자가 진단으로 현재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센트로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세요
센트로의 변호사는
수많은 소송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법무법인 센트로
21년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Address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층, 7층(서초동, 기계설비건설서초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4-10
- Tel
- 02.532.6327
- Fax
- 02.532.6329
subway
23교대역 6번출구 약 80미터 직진, 도보 5분
car
네비게이션에 목적지 [법무법인 센트로] 설정
(※ SUV, 중대형차량, 수입고급차량은 주차 불가, 외부 유료주차장 이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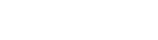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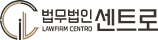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